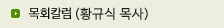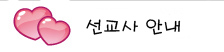글 수 167
지난 목요일 저녁 무렵에 최금례 권사님의 소천 소식을 전해 들었다. 수년 전, 아들 내외가 교회를 옮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권사님의 소식이 그 후에도 간간히 들려오는데 그때마다 내 마음이 많이 아팠다.
십 수년 전, 분당 매화마을 교회 시절에 며느리의 뜻을 따르시겠다며 오랜 세월 믿어오던 불교와의 작별을 하시고 우리 교회로 처음 나오신 권사님은 정말 순수하시고 깨끗하신 분으로서 평생을 선하게 사신 분이심을 한 눈에 알 수 있었다.
둥글게 생기신 얼굴엔 굵은 주름이 여러 가닥 깊게 파이셨지만 가만히 앉아 계실 때나 활짝 웃으실 때나 안동 하회마을의 선하게 표정 짓는 탈과 같이, 푸근한 어머니와 같은 분이셨다.
믿음 안에서의 첫사랑이셔서 인지는 몰라도 목회자인 나를 많이 좋아하시며 의지하셨던 권사님께선 아마도 평생을 함께 신앙생활을 하실 걸로 생각하셨던 것 같았다.
가족과 함께 교회를 옮기시기 몇 해 전, 평창 수양관에서 대화중에 “내가 죽걸랑 목사님이 거둬주셔야 혀~” “예, 권사님!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당연히 제가 해드려야지요”- 했는데 막상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으니 내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이젠 섬기는 교회의 목사님도 계시는데 내가 가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하는 생각이 들기에 우선 조화부터 보내 드리고 개별적으로 조문을 하도록 장례위원회에 지시를 하였다.
교회를 옮기신 이후에도 교회와 성도들을 그리워하시며 눈물을 흘리셨다는 얘기, 그리고 목사님이 보고 싶다는 얘기 등을 전해 들을 때마다 내 가슴이 아팠었다.
나는 고민 끝에 아내와 함께 문상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장례식장을 향해 차를 몰았다. 국화꽃 한 송이를 들고 영전에 서니 웃을 듯 말 듯한 최 권사님의 사진이 나를 보고 계셨다.
그 사진의 얼굴을 한번 손으로 만져 드리고 싶었지만 감정조절이 안될 것 같아 억지로 참았다. 문상을 마치고 나니 그 전에 함께 신앙 생활했던 낯익은 얼굴들이 여럿 보였다.
세월이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집착되어 그릇 행한 일들이 아쉽고 후회스러울텐데 왜 그때는 그런 행동들을 했을까? 왜, 순수하신 최 권사님의 그 마음의 소원 하나를 들어 드리지 못하게 되었을까? 모두 부족한 나의 부덕 때문이겠지....
오! 주여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다시는 이런 아픔 있지않게 하소서.
(주후 이천십이년 시월 첫째주)
십 수년 전, 분당 매화마을 교회 시절에 며느리의 뜻을 따르시겠다며 오랜 세월 믿어오던 불교와의 작별을 하시고 우리 교회로 처음 나오신 권사님은 정말 순수하시고 깨끗하신 분으로서 평생을 선하게 사신 분이심을 한 눈에 알 수 있었다.
둥글게 생기신 얼굴엔 굵은 주름이 여러 가닥 깊게 파이셨지만 가만히 앉아 계실 때나 활짝 웃으실 때나 안동 하회마을의 선하게 표정 짓는 탈과 같이, 푸근한 어머니와 같은 분이셨다.
믿음 안에서의 첫사랑이셔서 인지는 몰라도 목회자인 나를 많이 좋아하시며 의지하셨던 권사님께선 아마도 평생을 함께 신앙생활을 하실 걸로 생각하셨던 것 같았다.
가족과 함께 교회를 옮기시기 몇 해 전, 평창 수양관에서 대화중에 “내가 죽걸랑 목사님이 거둬주셔야 혀~” “예, 권사님!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당연히 제가 해드려야지요”- 했는데 막상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으니 내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이젠 섬기는 교회의 목사님도 계시는데 내가 가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하는 생각이 들기에 우선 조화부터 보내 드리고 개별적으로 조문을 하도록 장례위원회에 지시를 하였다.
교회를 옮기신 이후에도 교회와 성도들을 그리워하시며 눈물을 흘리셨다는 얘기, 그리고 목사님이 보고 싶다는 얘기 등을 전해 들을 때마다 내 가슴이 아팠었다.
나는 고민 끝에 아내와 함께 문상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장례식장을 향해 차를 몰았다. 국화꽃 한 송이를 들고 영전에 서니 웃을 듯 말 듯한 최 권사님의 사진이 나를 보고 계셨다.
그 사진의 얼굴을 한번 손으로 만져 드리고 싶었지만 감정조절이 안될 것 같아 억지로 참았다. 문상을 마치고 나니 그 전에 함께 신앙 생활했던 낯익은 얼굴들이 여럿 보였다.
세월이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집착되어 그릇 행한 일들이 아쉽고 후회스러울텐데 왜 그때는 그런 행동들을 했을까? 왜, 순수하신 최 권사님의 그 마음의 소원 하나를 들어 드리지 못하게 되었을까? 모두 부족한 나의 부덕 때문이겠지....
오! 주여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다시는 이런 아픔 있지않게 하소서.
(주후 이천십이년 시월 첫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