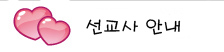글 수 410
늘 내 품에 파고들어 팔을 베개 삼아 잠자리에 드는 우진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녘에 내 선잠을 깨우는 철순이. 내 옷깃이 접혀져 있거나 서랍이 열려져 있을 땐 옷을 말끔히 펴주고 서랍도 꼼꼼하게 닫아주는 정우씨. 그리고 너무나 고마운 내 오른팔 상준씨.
세상 어떤 수식어로도 이들을 표현하기엔 부족하지만 이들이 세상에서 내가 버틸 수 있는 무게중심이 되어준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
이름을 큰소리로 부르며 호통칠 때도 있고 엉덩이를 때리며 질책할 때도 있다. 그러나 '우진아! 철순아! 상준씨! 정우씨!'' 하고 목소리를 높여대며 이들의 이름을 부를 때에, 생활재활교사로서, 스물 여섯 엄마로서의 사랑이 배어 있음을 이들은 알까?
가끔은 아무리 정신지체 장애인이지만 내 마음을 너무 몰라준다고 서운해하는 마음이 있음도 이들은 알까?
얼마 전 철순이의 똥 묻은 바지를 빨다가 서럽게 눈물 흘렸던 기억이 난다. 방금까지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당연히 그럴 수 있는 일인데 왜 갑자기 서럽고 슬프고 속이 상하던지….
이들의 삶이 어제가 오늘 같고 내일도 오늘 같으리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의 삶에도 작은 움직임과 변화는 있다는 것이다
재활 프로그램이니 중증 프로그램이니 성교육이니…. 재활과 교육 차원의 분명한 변화를 주겠지만, 이들의 마음과 눈과 손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나, 우리 생활재활교사들의 깊은 애정과 관심이 아닐까….
하루에 다섯 번씩 화장실 주변에 끙아를 해 놓아도 뒷일을 부탁하며 날 찾는 우진이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써줘요, 형!'하며 날 귀찮게 하던 상준씨지만 언젠가 내 팔짱을 끼면서 '선생님 밥 먹으러 같이 가요'하며 챙겨 줬을 때 얼마나 눈물나게 고마웠는지 모른다.
정우씨는 자폐증으로 늘 내 눈치를 살피고 짜증 섞인 군소리를 내지만 잠자리에서도 어디 정리할 데 없나 살펴보며 벌떡 일어나 접힌 이불 매무새를 펴곤 할 때면 나이를 먹어도 이렇게 귀여울 수 있구나 하고 피식 웃음이 나온다.
철순아, 아~ 제발 오늘은 잠 좀 푹 자게 해주렴. 자기 전 철순이 양 볼에 뽀뽀를 하며 기도하듯 하는 말이지만, 예외는 없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 철순이 어머님께는 죄송한 말이지만, 가장 보람 있는 것은 친엄마도 못 알아보던 철순이가 이젠 나를 알아보고 내가 이름 부르면 뒤도 돌아보고, 이제는 신을 신길 때 발을 스스로 올려 준다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웃을 수밖에 없는 이유,
자는 줄 알았던 상준씨가 벌떡 일어나 '써줘요, 김 ~ 융 ~ 정'하며 볼펜을 내 손에 쥐어주기 때문에….
"상준씨! 융이 아니라 윤이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