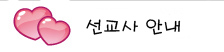글 수 410
내가 막 대학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시골에 계시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시러 서울에 올라오셨다.
당신께서는 몇 달만에 보는 아들에게 뭔가 사 먹여야 겠다는 생각에 근처 식당에 데려 가셨다.
그곳은 학교 부근 중국집이었는데,아버지께서는중국집이 처음이셨다.
시골에서 농사만 짓던 노친네가 어찌 중국집에 가 본 적이 있었겠는가?
우리는 그 집에서 짜장면을 시켜서 먹었는데,짜장면을 한 손으로 비비지 않고 두 손으로 섞는 모습이 영 못 마땅하셨는 지
"사람이 점잖지 못하게 그게 뭐냐?"고 하셨는데 난, "편하면 되지" 하며 고집을 부렸다.
그런 나를 주름진 눈으로 힘없이 가만히 보시던 기억이 난다.
이제 내 나이 일흔을 지나, 그때 내 아버지 나이보다 훨씬 더 늙은 아버지가 되어 보니 내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 그립다.
'그때 거기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것이 비합리적 아니 잘못된 것일지라도 그렇게 한다고 대단한 큰 일이 일어 나는 것도 아니었는데...
요즘 와서 아버지의 그 슬픈 눈이 자꾸만 떠 오른다. - 김형석 교수의 회고록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