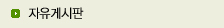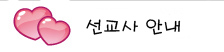어느 성탄절 전야의 추억
세계 2차대전 때 어느 성탄절 전야에
네덜란드의 국경선 근처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다.
그 날은 주먹 같은 눈발이 세찬 바람과 함께 휘몰아치고
마을 거리에 사람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밤이었다.
미군 한 소대가 정찰 도중 거센 눈보라에 길을 잃고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 쉴 곳을 찾고 있었다.
이 마을을 찾기는 했으나
집들은 사람이 살지 않아 땔감도 없고 먹을 것도 없었다.
그런데 유일하게도 자그마한 오두막집 한 채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왔다. 그 집을 찾아 문을 두드렸다.
다행히 그 집에 사는 할머니 한 분이 그들을 맞아 주었다.
거실 벽난로에는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서
온 실내가 따뜻했고 난로 옆에는
갓 구운 감자가 소쿠리에 담겨 있었다.
그 냄새에 굶주린 병사들은 군침을 삼키며
그 할머니의 말씀이 떨어지길 기다렸다.
할머니는 그 소쿠리를 앞에 놓고는 먹기를 청하였다.
말이 떨어지자마자 병사들은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곡간으로 가서 더 많은 감자를 가지고 돌아왔다.
갑자기 또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집안의 미군 병사들은 먹던 감자를 내던지고
총을 들어 경계태세를 취했다.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할머니가 일어나 문 앞으로 다가가서 천천히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미군 병사처럼 추위와 굶주림에
지친 독일군 병사 한 소대가 있었다.
순간 양쪽 병사들은 서로가 총을 겨누었고
등골이 오싹한 또 한 차례 침묵이 잠시 흘렀다.
할머니가 평온하면서도 단호하게 말했다.
"여기는 내 집이오. 그리고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가 아니오?
오늘밤 하루만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야만적인 일을 그만두시오.
지금부터 내 집에서는 미국군도 없고 독일군도 없소.
자! 총들을 내려 놓아요."
또 한 차례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까와 달리 어떤 항거할 수 없는
내면의 힘이 그들을 압도하는 것을 느꼈다.
적개심이라는 인간의 부정적인 감정이 그 힘 앞에서 무력해 졌다.

"오늘은 성탄절 전야다.
그리고 여기는 할머니의 집이다."
라는 말에서 양쪽의 병사들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슴 뭉클함을 느꼈고 어릴 적 크리스마스 이브의 추억으로 감회에 젖었다.
할머니의 얼굴에서 고향집의 어머니, 할머니가 생각났고
상대 병사들의 얼굴에서 형제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어느새 그들의 긴장하고 경직되었던 어깨에서
힘이 빠지고 총을 꽉 움켜쥐었던 손은 풀렸다.
어느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서로에게 겨누었던
총부리는 땅으로 숙여졌다.
한사람 한사람 차례대로 할머니에게 총을 맡겼다.
그리고는 어느 편이라고
구분없이 벽난로를 중심으로 섞어 앉았다.
의자가 부족한 탓으로 어떤이는 벽에 기댄 채,
어떤이는 바닥에 앉아서는 서로 말은 잘 통하지 않았지만
몇 마디 영어로, 혹은 더듬거리는 독일어로
손짓발짓을 섞어 돌아가며 자신을 소개했다.

성탄절 전야의 만찬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칠면조 고기 한 점 없고 달콤한 와인 한 잔 없는
그저 구운 감자와 따뜻한 물이 전부지만,
병사들의 성탄절 추억과 전쟁 전의 고향 이야기가
그 소박한 오두막집의 성탄 전야를 한층 평화롭게 해주었다.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의 이야기,
그리고 땅ㆍ날씨와 수확 이야기며,
학교ㆍ공장과 병원의 이야기도 했다.
그들은 단지 성실한 농민이며 노동자이고 학교 선생님, 화가였다.
그들 서로간에 어떤 미워해야 할 그 무엇이라고는 찾아 볼 수가 없는
그냥 평범한 이웃사람과 똑같은 사람들이었다.
화기애애한 얘기 중에서 그들은 문득 의문이 일었다.
왜 우리는 서로 죽여야 하는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그들도 부모형제가 있고 그들이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랑하는 친구가 있는데.
다음날 아침 그들은 각자의 총을 챙겨서는 자기 부대로 돌아갔다.
그들 각각은 서로가 속내를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과연 다음 전쟁터에서 적이라고 하는 저들을 향해
총을 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